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수준의 노사협약
1. 들어가는 말
산업자원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3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해외 투자는 모두 11,710건으로 투자액은 229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 홍콩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 국가에 대한 제조업 투자는 9,369건이고, 투자액은 103억 달러로 전체 해외 제조업 투자액의 약 45%를 점하고 있다. 2003년 9월말 현재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 해외 투자를 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48.5%는 해외투자 이유로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들고 있다. 특히 27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으며 종업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2,026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33.7%가 ‘국내 공장을 5년 내에 축소하겠다’고 응답했고, 8.1%는 ‘폐쇄하겠다’고 응답하여,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로 인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산업자원부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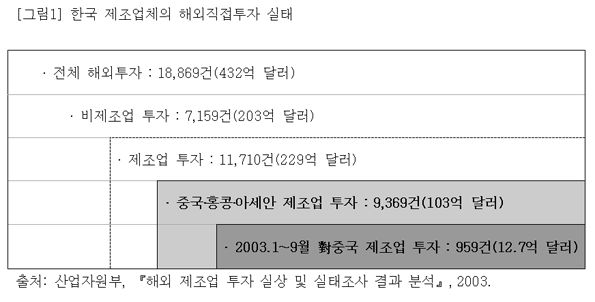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가져오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국내 일자리의 감소이다. 산업공동화에 따른 국내 일자리 축소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실업 증가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 주체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며 사회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협약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개별 기업들과 노동조합인데, 국내 일자리 보존을 위한 기업 수준의 구체적인 해법에 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현재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여 국내 일자리를 지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론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독일의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 노사협약”을 검토한다.
2. 이론적 논의
노사관계 관점에서 국내 투자 동기의 저하는 ‘홀드업’(hold-up)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관계와 관련된 홀드업 문제는 고용계약의 불완전성과 기업특수적 자본투자에서 기인하는 ‘협상후 기회주의’의 일종이다(Milgrom/Roberts 1992: 137~138).
고용계약 체결 당사자들은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쟁점 사항들을 협약으로 명문화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관계는 고용계약을 통하여 불완전하게 규정될 수밖에 없다. 불완전한 고용계약은 특히 협약 체결의 한 당사자가 기업 특수적 자본을 투자해야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노동자의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 투자나 사용자의 기업 특수적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 투자의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단 협약 체결의 한 당사자에 의하여 기업 특수적 자본이 투자되면, 이 자본은 다른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갖게 되므로, 기업 특수적 자본을 투자하지 않은 협약 체결의 상대방은 협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위협을 통하여 기업 특수적 자본투자자의 ‘유사지대’(類似地代, quasi-rent)를 강탈하고자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강탈의 위험을 ‘홀드업 문제’라고 한다(Kraekel 1999).
기업이 일단 기업 특수적인 물적 자본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자본의 기업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기업에서 이 자본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처럼 해당 기업에서의 물적 자본 가치와 여타 기업에서의 가치 사이의 차이가 ‘유사지대’이다. 기업은 유사지대가 0 이상일 경우에 투자된 자본을 유지하지만, 유사지대가 0 이하로 떨어지면, 자본을 회수하고자 할 것이다. 기업의 노동조합은 기업측의 이러한 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측의 유사지대가 0 값에 근접할 때까지 임금인상을 통하여 유사지대를 강탈하고자 할 수 있다. 기업측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지대지향적(rent-seeking) 태도에서 발생하는 홀드업 문제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적 자본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이처럼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은 기업의 물적 자본 투자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Baldwin 1983; Grout 1984; Connolly/Hirsch/Hirschey 1986; Hirsch/Connolly 1987; Crawford 1988; Addison/Hirsch 1989; Freeman 1992).
한편, Addison과 Chilton(1998)의 게임이론적 모형에 따르면, 사용자측의 관점이 충분히 장기적이면 홀드업 문제에서 파생되는 투자 기피 및 고용수준 저하 문제를 극복하고,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효율적인 자본투자와 고용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노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이 지나친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는 전제 하에, 기업은 효율적인 국내 자본투자와 고용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암묵적인 약속을 한다. 만약에 노조가 이를 어기고 지나친 임금 인상을 추구하면, 기업도 이러한 암묵적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국내에 효율적인 자본투자와 고용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노동조합은 적정한 임금 인상을 암묵적으로 약속한다. 만약에 기업이 이를 어기고 현지의 자본투자 수준을 낮추어 해외투자를 실시하고 현지의 고용 수준을 낮춘다면, 노동조합 역시 노사협력을 위한 암묵적 약속을 파기한다. 국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이러한 암묵적 약속은 사용자가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경우에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현실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자본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투기자본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단기적 관점을 갖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품질 우위 경쟁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우위 경쟁력에 의존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이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에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명시적 협약(binding contracts)을 체결해야만 자본투자와 고용수준 측면에서 효율적인 협약에 도달할 수 있다(Grout 1984; Rosd?cher 1997). 기업측은 이러한 명시적 협약에 해외투자 대신에 현지 공장을 유지하거나 투자수준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여 고용수준을 유지 혹은 확대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자제를 명시화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여 단위임금당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측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공언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는 i) 교육훈련을 통하여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ii) 유연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iii) 팀제와 성과급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겠다.
3. 독일의 사례: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 노사협약
수년 전부터 독일의 여러 기업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 노사협약(B?dnisse zur Besch?tigungssicherung und Wettbewerbsst?rkung)”은 이러한 자본투자와 고용수준에 관한 효율적 협약의 이론적 모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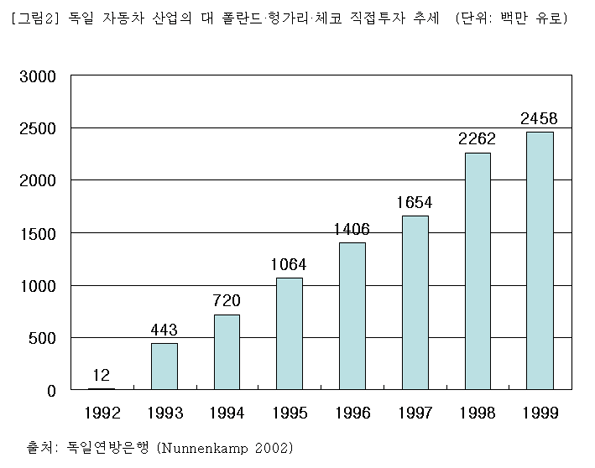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수준의 노사협약이 독일에서 대두된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변화된 경제적 환경을 들 수 있다. 독일 경제는 1993년에 심각한 경기 불황을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자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경기 악화와 국제 경쟁의 격화로 기업들은 존립의 위기를 느끼고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몰두하게 되었다. 유럽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수준인 동유럽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났고 독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Huege 1999).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기업 수준 노사관계 당사자들은 효율적 협약을 통하여 기업의 이익과 노동자의 효용을 높이고자 하였다.
기업측은 독일 현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수준을 유지 혹은 확대할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사업장평의회(Betriebsrat)는 근로시간, 작업조직, 임금제도에 관한 경영혁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자본투자와 고용 수준에 관한 효율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산하 경제사회과학연구소(WSI)는 1999년과 2000년에 1,390개 사업장평의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2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 소속되어 있으며, 건설 및 화학 업종은 사업장평의회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약 30%가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1997년과 1998년에 조사된 결과와 비교하여 약 6% 증가한 수치이다.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 노사협약에 담겨 있는 사용자측의 수행 약속 조항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협약의 66%가 정리해고를 일정 기간 동안(일반적으로 향후 2년간) 배제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 투자 확대에 관한 조항(37%),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조항(20%), 아웃소싱 자제 조항(19%), 현재 고용수준 유지에 관한 조항(14%), 채용 확대에 관한 조항(11%)을 각각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eifert 2000). 즉, 국내투자 확대, 생산설비 해외이전 배제에 관한 조항들이 독일 국내에서 효율적인 수준의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사용자측의 약속이라면, 정리해고 일정 기간 배제, 아웃소싱 자제, 현재의 고용 수준 유지, 채용 확대 등과 관련된 조항들은 효율적인 고용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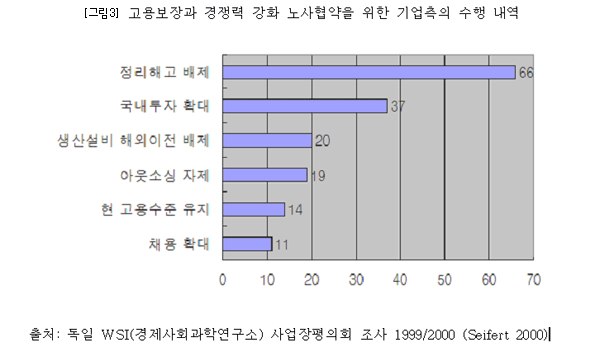
한편,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 노사협약에서 사업장평의회측이 약속한 내용들은 크게 근로시간, 조직, 임금 관련 사항들로 대별된다. 전체 협약의 82%가 근로시간 관련 조항을, 72%가 조직 관련 사항을, 19%가 임금 관련 사항을 담고 있다. 근로시간에 관한 조항들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에 노동자들의 자유시간을 확대하는 방안(63%), 고령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임금피크제 도입(38%), 연장근로시간 단축(36%), 단시간 근로제의 확대 시행(26%), 근로시간 연장(12%),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토요근무제 도입(10%), 집단휴가(10%), 임금 보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5%) 등 주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능률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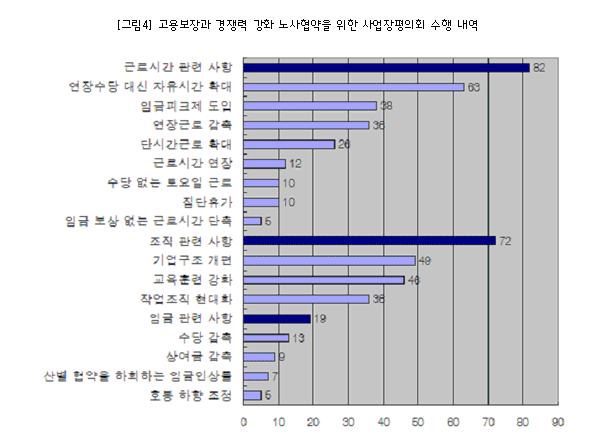
조직 관련 사항들은 기업구조 개편(49%), 교육훈련 강화(46%), 작업조직 현대화(36%) 등 조직구조의 합리성을 신장시키고 기능적 유연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이러한 방안은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를 가져오지 않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임금의 하향 조정을 언급하고 있는 사항들은 다른 두 부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수당 감축(13%), 상여금 감축(9%), 산별 임금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금인상률을 하회하는 임금인상률 설정(7%), 호봉에 따른 임금 수준의 하향 조정(5%) 등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소득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방안들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4. 한국 기업을 위한 시사점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공동화와 이에 따른 국내 일자리 수 감소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 당사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본투자와 고용수준에 관한 효율적 협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산업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입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 협약의 요체는 ‘주고받기(give and take)’이다. 노동조합은 일자리 보장을 위하여 임금 인하를 감수하거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해외투자 대신에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거나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위기적 요소가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노사관계 환경에서 한국의 기업과 노동조합은 독일의 사례와 같이 효율적 협약을 체결하여 노사관계 혁신과 신뢰 구축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등장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더 이상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우위 경쟁력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오직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하여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품질우위 경쟁력을 추구해야만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의 노동자들도 고용안정을 이루고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산업자원부(2003) 『해외 제조업 투자 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Ackermann, K. F. & Kammueller, M.(1999), Firmspezifische Buendnisse fuer Arbeitsplaetze, Schaeffer-Poeschel Verlag.
Addison, John T. ; J. B. Chilton(1998) Self-Enforcing Union Contracts: Efficient Investment and Employment. In: Journal of Business 71, Nr. 3, 349~369.
Addison, John T.; Barry T. Hirsch(1989) Union Effects on Productivity, Profits and Growth: Has the Long Run Arrived?. In: Journal of Labor Economics 7, Nr. 1, 72~105.
Baldwin, Carliss Y.(1983) Productivity and Labor Union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Self-Enforcing Contracts. In: Journal of Business 56, 155~185.
Connolly, Robert A.; Barry T. Hirsch; Mark Hirschey(1986) Union Rent Seeking, Intangible Capital, and Market Value of the Firm. I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8, 567~577.
Crawford, V.(1988) Long-term Relationships Governed by Short?term Contracts. In: American Economic Review 78, 485~499.
Freeman, Richard B.(1992) Is Declining Unionization of the U.S. Good, Bad, or Irrelevant? In: Lawrence Mischel, Paula B. Voos (ed.), Unions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New York/London: M.E. Sharpe, Inc..
Grout, Paul A.(1984) Investment and Wages in the Absence of Binding Contracts : A Nash Bargaining Approach. In: Econometrica 52, Nr. 2, 449~460.
Hirsch, Barry T.; Robert A. Connolly (1987) Do Unions Capture Monopoly Profits? I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1, 118~136.
Huege, Petra(1999) Direktinvestitionen in der Standortdebatte. In: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Heft 1, S. 19~30.
Kraekel, Matthias(1999) Organisation und Management. Tuebingen: Mohr Siebeck.
Milgrom, Paul; John Roberts(1992) Economics,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Rosd?cher, J?rg(1997) Arbeitsplatzsicherheit durch Tarifvertrag. Rainer Hampp Verlag.
Seifert, Hartmut(2000) Betriebliche B?ndnisse f?r Arbeit ? Eine neuer besch?ftigungspolitischer Ansatz. In: WSI Mitteilungen 7, S. 437~443.
Telser, L.G.(1980) A Theory of Self?enforcing Agreements. In: Journal of Business 53, No. 1, 27~44.
- 제작년도 :
- 통권 : 제 8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