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 이론에서 무엇이 살고 무엇이 죽었는가
*************************************************************************************
이 글은 영국의 노사관계 전문지(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December 2003)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전문을 2회에 걸쳐 싣는다.
*************************************************************************************
요약
‘조합주의(coporatism)’란 용어는 한편으로는 독점적이고 중앙화된 구조를 가지며, 내적으로는 비민주적인 특정한 이익단체의 ‘구조’를 가리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협의(concertation)’나 ‘사회적 파트너쉽’으로 알려진 특정한 정책형성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구조와 과정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면서 협의가 이해대표 체계의 비조합주의적 구조와 완벽하게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조직간 그리고 조직내의 조정은 협의의 가능성에 있어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처럼 상대적으로 분화된 체계에서도 민주주의와 토론에 기초한 대안적 기제를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
1. 도입
지난 30년 동안, 노사관계의 체계와 정치적 공간 사이의 관계에 흥미를 가졌던 학자들은 조합주의 이론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 협약 같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조직적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국가들(예를 들어,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남아공, 남한, 스페인)에서 소위 ‘사회협약’이 등장하자, 조합주의 이론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다.(Regini 1997, Fejertag & Pochet 1997, 2000; O'Donnell 2001; Berger & Compston 2002; Molina & Rhodes 2002, Katz 2004)
이 논문은 독점적이고 중앙화 되었으며, 내적으로 비민주적인 결사체로 설명되는 이해대표체계의 특정한 구조로서 조합주의와 특정한 정책형성의 과정으로서의 ‘협의’ 혹은 ‘사회적 파트너쉽’을 구분하고 있다. 구조로서의 조합주의와 과정으로서의 협의 개념은 논리적으로 다르지만, 종종 서로를 혼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단일 개념으로서의 ‘(신)조합주의’가 일반적으로 양자를 동시에 지칭하는 것으로 잘 쓰인다. 이 논문은 두 개념 가운데 정책형성 과정(협의)은 유럽에 국한되자 않고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국가들에서 발전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조합주의 이론의 살아 있는 측면인 반면, 이해대표구조로서의 조합주의는 아마도 죽은 것 같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이 주장은 조직간 그리고 조직내 결속(cohesion)과 조정(co-ordination)이 협의된 정책형성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이것들은 중요한 특징들이다. 그러나 결속과 조정은 다른 방식으로 성취될 수도 있다. 특히 조직적인 조정은 조합주의 이론이 주목했던 위계와 강제보다는 민주주의와 토론을 따르는 방식을 통해 성취 가 능하다(Baccaro, 2002b). 이는 정책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결과이다. 협의는 이전에 생각되었던 것 보다 훨씬 다양한 조직적 구조와 양립가능하다. 이러한 몇몇 대안적 구조들은 전통적인 조합주의 모델에 비해 명목상의 이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러한 구조들이 결사의 자유나 단체협상, 혹은 결사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들과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Schmitter 1983; Cawson 1986; Streeck 1994; Schreiner 1994)
사회적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예상치 못했던 두 사례 국가(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성공 사례는, 만일 조직적 조정의 민주적 기제가 활성화될 경우, 협의가 이해대표체계의 비조합주의적 구조 아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증명해 준다.
이 글의 2장에서는 조합주의 이론에 대한 짧을 개관을 제시한다. 3장은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의 궤적을 검토한다. 4장은 아일랜드 및 이탈리아의 노동운동이 조직간 그리고 조직내 조정의 문제를 풀어내는 총괄적이고 세밀한 특별한 기제를 검토한다. 5장은 두 나라의 사회적 파트너십의 내적 과정을 재구성한다. 6장은 주장을 압축적으로 요하고, 7장은 협의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2. 조합주의 이론 개관
초기 조합주의 문헌들은 구별된 두 개의 개념으로 조합주의를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필립 슈미터(Philippe Schmitter)가 정의한 것으로 ‘이해대표체계의 차별적인 조직 특성’을 강조한다. 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합주의는 이해대표의 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체계의 구성단위는 단일하고, 강제적이며, 비경쟁적이고, 위계적이다. 그리고 기능에 따라 구별된 범주들로 조직될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허가된다(거의 없지만 국가에 의해 창출될 수도 있다). 또한 지도자의 선출, 각각의 단위 요구와 지지의 표현에 대한 통제의 대가로 정교한 대표성의 독점을 부여받는다.(Schmitter 1979(1974): 13)
두 번째는 게르하르트 렘브르흐(Gerhard Lehmbruch)가 정의한 것으로 공공정책이 형성되는 특수한 과정에 주목한다.
조합주의는 이해들(interest)을 접합(articulation)하는 것 이상의 특정한 패턴이다. 오히려 조합주의는 정책 형성의 제도화된 패턴이다. 그 안에서 거대한 이해조직들이 이해를 접합(혹은 ‘상호중재’까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발전된 형태로서) ‘가치관(기준)의 권위주의적 할당’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실행하는데 서로 협력하거나 공공기관과 협력한다.(Lehmbruch 1979(1977): 150)
명백하게 두 개의 정의는 토대가 다르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슈미터(Schmitter, 1982: 263)는 조합주의를 ‘첫 번째’ 정의로 그리고 협의를 ‘두 번째’ 정의로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Regini 1997: 269; Compston 2002:3; Molina & Rhodes 2002: 306). 동시에 조합주의와 협의는 경험적으로 밀접히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며, ‘신조합주의’란 용어가 양자 모두를 지칭한다. 이해대표체계와 관련된 조합주의의 특징들은 협의에 대한 구조적 전제로 간주되었다. 달리 말해서 ‘독점적이고, 위계적이며, 공식적으로 승인된 동시에 명백히 한계를 가진 결사체’라는 이상적인 조합주의 형태에 근접하는 이해대표의 구조가 없다면(Schmitter 1979: 13), 협의는 적절히 작동할 수 없다. 이탈리아와 영국, 그리고 1970년대 후반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계약이 실패한 경험은 이 주장의 진실을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다(Regini 1984; Hardiman 1988).
협의는 이해대표체계의 구조가 사회적 이해가 자유롭게 조직되지 않았던 1920년대나 1930년대 조합주의적인 유럽사회의 구조와 유사할 때 가장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제한된 숫자의 행위자(이상적으로는 한 명이다)가 교섭테이블 각각의 자리에 앉아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자는 산별 단위에서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작업장 단위에서 그들의 하위단위 지부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조합주의 문헌은, 최소한 초기에는 노동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사실상 조합주의가 다뤘던 정책들은, 노동자들이 불확실한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 확실한 현재의 보상을 포기해야만 하는 내용들이었다. 노조가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노동자의 순응 혹은 묵인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으로 간주되었다. 이때 노조의 조직 특성들은 두 개의 상이한 시각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평적 조정이다. 복수노조는 그들의 개구리 뛰기(leapfrogging) 경향 즉, 다른 노조가 이미 얻은 것보다 약간 많이 요구하는 경향으로 인해 하나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노조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의는 낮아졌으며, 개구리 뛰기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Golden 1993: 439; Iversen 1999: 48~57). 두 번째 시각은 수직적 통제다. 즉, 최고단위에서 협상된 내용을 초과하려 하는(혹은 악화시키거나, 무시하는) 경향 때문에 기능적 자율성이 충분한 낮은 수준의 구조 역시 하나의 문제였다(Schmitter 1979: 13; Streeck 1982: 32; Traxler et al. 2001: 107).
실제로 수평적 조정과 수직적 통제를 달성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그 안에서의 표현의 자유(Lange 1983: 432-4)라는 두 종류의 노동자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추구하는 정책에 불만족할 경우, 대안적 결사체에 합류하거나 설립하는 노동자의 권리(‘퇴장의 자유(exit option)’)는 축소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조합주의 문헌들은 독점적 결사체 및 강제적 혹은 준-강제적 멤버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Offe 1981; Panitch 1979). 또한, ‘영향력의 정치(voice option)’를 통해서 해당 결사체의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능력은 줄어들어야 했다. 최고 수준의 지도자의 수중에 의사결정의 힘이 집중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고의 배후에는 현장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지도자들보다 좀더 근시안적이거나 단기적 경향을 가진다는 가정이 있다. 즉, 현장 노동자들에게만 맡겨진다면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이해에 반하는 정책들에 서명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이다(Streeck 1982: 71; Schumpeter 1950: 260~1).
이러한 이론적 전제와는 대조적으로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협약의 최근 경향은 조직적 구조(조합주의)와 정책형성과정(협의)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협약은 이해대표체계의 구조가 기대된 것보다 더욱 분화되어 있거나, 중앙 조직의 규율적 권력이 훨씬 더 제한된 국가들(예를 들어 남부 유럽국가들, 아일랜드, 남아공 및 남한)에서 표면화되거나 종종 번성하기까지 했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는 이러한 두 개의 사례이다. 양국은 일반적으로 조합주의와 관련된 중앙화된 조직적 능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Hardiman 1988: 3; O'Donnell & O'Reardon 1997: 85; Tarantelli 1986: 348~82). 그러나 1990년대 동안 이들 두 나라에서 모든 주요한 정책형성은 (아일랜드식 용법으로) ‘사회적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 혹은 (이탈리아 용법으로) ‘콘체르타찌오네(concertazione)’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본 글은 이제 조합주의적 구조가 부재한 협의라는 명백한 역설을 설명하고,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기초적인 재구성을 수행할 것이다.
3.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파트너십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 노조와 사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다섯 번의 연속적인 사회적 파트너십 합의(1996년부터는 농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참여하였음)가 임금과 공공정책을 형성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첫 번째 사회적 파트너십 합의는 ‘국가회복프로그램(PNR; 1988~90년)’이었다. 이 합의안이 서명될 당시, 정부 부채와 예산 적자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 투자는 정체되었으며, 증가하는 해외 이민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치솟고 있었다. 여기서 비롯된 위기 의식이 중앙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가회복프로그램(PNR)을 통해, 아일랜드노총(ICTU)은 국가 수준에서 협의된 한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아일랜드노총은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노동쟁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후자의 문구는 1970년대식의 중앙화된 합의를 특징지웠던 이중교섭(two-tier bargaining)의 관행으로부터 중요한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Hardiman 1988:80~120; Roche 1997:179~82). 그 대가로 정부는 개인 조세는 줄이되, 사회복지 수당의 실제 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국가회복프로그램(PNR)이 진행된 3년(1988~90년) 동안, 아일랜드의 경제는 매우 호전되었다. GNP는 해마다 3.6%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고, 다른 모든 거시경제적 지표에서도 뚜렷한 향상을 보였다. 이후 몇 년 동안, 사회적 파트너십은 아일랜드 경제정책의 골간이 되었다. 국가회복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사회적 진보를 위한 프로그램(1991~3)’은 모든 경제 부문에서 동시에 임금을 상승시켰다. 그것은 또한 ‘예외적으로’ 3%까지의 임금인상이 지역수준에서 협상될 수 있도록 했다. 엄청난 규모의 지역적 합의가 3% 조항을 실제 실행해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러한 추가적인 지불분을 작업장 재구조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키고자 했다(Roche 1997: 208).
1990년대 초반은 아일랜드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실업이 다시 증가하는 등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변화하는 경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트너십의 전략은 변화하지 않았다. ‘경쟁력과 노동프로그램(PCW)’(1994~96년)은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경쟁력과 노동프로그램(PCW) 안에서 각 사회적 파트너들은 임금 완화 정책을 유지했으며, 총소득과 실제 수입 사이의 차이를 추가적인 조세인하를 통해 줄여나갔다.
‘파트너십 2000(P2000)’(1997~9) 합의는 두 개의 주제에 중심을 맞췄다. 즉, 사회적 파트너십을 개별 기업단위까지 확장할 필요성과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그것이다. 기업 수준의 파트너십에 주목한 이유는 국가적 수준이나 작업장 수준과 마찬가지로 협력적 관계는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상호이익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규범적이라기보다는 권고안의 성격을 가졌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기업 단위의 파트너십은 아일랜드에서 넓게 확산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Roche & Geary 2000; Gunnigle et al. 1999).
‘2000~2 변형과 형평을 위한 프로그램(PPF)’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은 그 강조점을 거시경제정책으로부터 좀더 공급 지향적 정책으로 이동했다. 실업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며, 노동과 숙련의 저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합의안은 숙련향상, 산업기반 투자(예를 들어, 도로 및 공공운송), 좀더 저렴한 주택의 공급과 아동보호 시설의 발전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한 일련의 권고안을 포함했다. 200-~2 변형과 형평을 위한 프로그램(PPF) 합의는 사회정책에 상당히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급여와 아동급여는 증가했다. 합의된 임금부분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임금완화 정책도 유지되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아일랜드의 사회적 파트너십은 큰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1988년에서 2000년까지 아일랜드의 실제 GDP는 132%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의 45%, EU의 32%와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이었다. 중앙화된 임금결정은 아일랜드의 제조부문 특히, 다국적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산업부문의 경쟁력을 상당히 증가시켰다(Baccaro & Simoni 2002). 또한 사회적 파트너십은 경기순환과 정부연합 내의 정치적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 대단히 탄력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사회적 파트너들은 새로운 합의안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아일랜드의 노동시장은 현재 완전고용에 근접해 있으며, 이는 교섭의 중앙화를 과거보다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트너십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1990년대의 이탈리아 정책결정은 아일랜드의 사례와 유사한 경로를 따랐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기의 몇몇 단기적 시도가 있은 이후, 이탈리아의 협의체제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해 7월,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한 공통의 인식으로 인해, 정부와 3대 주요 노총(CGIL, CISL, UIL), 그리고 주요 사용자연합인 ‘꼰핀두스뜨리아(Confindustria)’는 임금물가연동제(scala mobile)를 폐지하고 기업단위 임금협상에서 1년의 지불유예를 도입하는 반인플레이션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 합의안은 임금물가연동제(Scala mobile)의 폐지가 이탈리아에서 상징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특히 중요했다(Locke 1994).
1993년 7월에 채택된 새로운 3자주의 합의안은 임금물가연동제 폐지를 확정하고 전국단위의 임금협의체제를 도입하여 임금인상을 연간예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은 정부의 거시경제적 목표에 연계시키고자 했다. 잠정적으로 공장단위의 교섭을 금지시켰던 1992년 합의와는 다르게, 새로운 합의안은 매 2년마다 산업수준에서, 매 4년마다 공장/지역 수준에서의 협상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단체협상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체계를 도입했다. 이 합의안은 사용자가 단체협상의 단일 장소(single locus)를 밀어붙인 이래로 노조 운동의 중요한 승리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1995년에 정부와 3대 노총(사용자단체는 제외)은 이탈리아 복지국가의 가장 큰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연금체계의 구조 개혁을 협상했다. 복지급여는 더 이상 과거 소득의 결과가 아닌 사회보장 기여금의 정도에 따라 정해졌다. 단기적으로 이 개혁은 소위 ‘연공연금제(seniority pensions; 조기퇴직계획의 특수한 형태)’로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개혁의 전체적인 목표는 연금 지출을 줄이고,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예산 부족을 줄이는 것이었다.
1996년, 사회적 파트너십은 정책의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갔다. 3자 주의에 근거한 ‘노동을 위한 협약(Pact for Work)’은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 노동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성을 증가시켰다. 연합정부의 핵심 그룹이었던 재건공산당의 반대로 인해, 협약이 실제로 입안될 당시에는 많은 행정규제상의 변화들이 희석되었다. 협약은 또한 경제발전 이슈에 대해 지역협약 즉, 지역 수준의 협의를 장려함으로써 위기에 닥칠 경우 직업창출을 촉진하고자 했다.
1997년, 정부와 노조는 또 다른 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사실상 1995년의 연금 개혁은 긴 전환의 시기를 거쳐야만 완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개혁이었다. 따라서 개혁을 위한 긴 시간 사이에는 앞선 체제의 좀더 관대한 규칙들이 노령 노동자들을 위해 유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 1997년의 연금 개혁은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재건공산당의 반대로 인해 새로운 규칙들은 단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1998년 12월, 3대 노총, 정부 그리고 꼰핀두스뜨리아는 소위 ‘크리스마스 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1993년에 도입된 바 있는, 두 가지 수준에 기초하는 단체협약을 공고히 했으며, 사회적 협약의 관행을 굳건히 하고 확대시켰다. 예를 들어, 이 협약으로 인해 정부는 사회적 파트너들과 모든 사회정책 이슈들에 대해 협의해야 하며, 몇몇 경우에는 의사결정 권한을 사회적 파트너들에게 위임하여 그들이 직접 정부개입의 필요성 없이 특정한 이슈들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2002년 정부와 꼰핀두스뜨리아 및 2개의 노총(CISL과 UIL)은 ‘이탈리아를 위한 협약(Pact for Italy)’을 타결했다. 협약의 구조는 아일랜드의 3자주의 합의안과 유사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가 해고에 대해 좀더 유연한 규제를 따르는 대신 조세 삭감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대단히 논쟁이었다. 최대 노총인 CGIL은 합의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으며 노동자들을 이 합의안에 반대하도록 동원했다. 증가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1년 선출된 바 있는 새로운 중도우익 정부는 이를 추진해 나갔다.
이탈리아 노동부의 최근 백서에 따르면 2001년에 선출된 중도우익 정부는 ‘사회적 대화’ 정책에 우호적이며, 만약 사회적 파트너들이 그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기만 한다면 직접적 규제를 삼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자신의 개혁 기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있다(Biagi et al. 2002: 56~9). 지금까지 이러한 새로운 전략적 방향은 부분적인 동의(3대 주요 노총 가운데 2 곳만 동의)를 이끌어냈다. 3자주의적 정책결정이 이러한 축약된 형식으로 지속될 것인지, 혹은 증가하는 노조간 갈등으로 인해 궁극적인 해체로 이어질 것인가는 아직 불명확하다.
아일랜드의 사회적 파트너십보다는 경제적으로 덜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이탈리아의 협의체제는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협의체제로 인해 사실상 이탈리아 정치·경제 당국은 첫째, 대처하기 어렵던 사회·정치적 위기로부터 국가를 구출해낼 수 있었으며, 유럽경제통화동맹(EMU)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대중적 합의를 모을 수 있었다(Salvati 2000: 83~107; Modigaliani et al. 1996: 45~90). 노동조합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점, 하위 구조에 대해 중앙 조직의 강제적 통제가 부재했던 점, 그리고 작업장 수준의 갈등이 매우 높다는 특징으로 인해, 이탈리아는 조합주의의 다양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바닥이었다(Dell'Aringa & Lodovici 1992: 33). 아일랜드도 역시 전국 수준의 교섭을 낳고 지속시키는 조직적 정치적 조건, 특히 높은 수준의 ‘권위적 중앙화’(Hardiman 1988: 3)를 가진 강하고 강제성 있는 노동운동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중앙화된 조직적 능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양국은 대안적이며, 공히 효과적이었던 조직간 조정 메커니즘을 발전시켰다. 다음 장은 이러한 조정 메커니즘을 분석할 것이다.
4. 집합적(aggregative), 심의적(deliberative) 메커니즘을 통한 조정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노사관계는 전형적인 조합주의 모형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둘 사이에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아일랜드 체계는 주로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노조와 사용자간의 자원주의적(voluntaristic) 단체협상체제인 앵글로-색슨 모델에 가깝다. 반면, 이탈리아체계는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정의하고 노동조건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훨씬 더 많은 국가개입이 존재해왔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가장 중요한 단체협상 수준은 산업수준이다.
1995년 당시 52개 노조가 소속된 아일랜드노총(ICTU)과 59개의 노조가 소속된 이탈리아의 3대 노총(CGIL, CISL, UIL)의 노동운동은 상당히 분열되어 있었다. 양국의 노동자들은 복수 노조 사이에서 한 노조를 선택할 수 있었다. 작업장 대표체계는 일반적으로 강력하고, 그 조직원에 대해서(이탈리아의 경우, 비조직원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선출직 대표체제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최고 수준에서는 산하 노조들에 대해서 제명이라는 위협의 방식을 제외한다면 공식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아일랜드에서 탈집중화된 단체협상 구조는 권위적 중앙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달리 말해서 전국수준에서 협상된 임금 가이드라인이 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제조업부문의) 기업 수준의 단체협약안에 삽입되어야 한다(Gunnigle et al. 1999: 188). 그런데 아일랜드노총은 기업 수준의 협약이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따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방법이 없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노동조합의 교섭 구조는 자신의 조항과 조건들을 적합한 교섭 대상과 협상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자유롭다.
조합주의 이론은 조직적 협의와 타협적인 정책결정에 대한 구조적 전제조건으로서 노조에 대한 수직적 통제를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대표 구조는 협의체제를 유지하기에 너무 약하고 분할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재생산시킬 수 없다. 그러나 조합주의 이론은 오직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위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노조지도부가 노동자들이 반드시 승인하지 않아도 되는 합의안에 대해서 그들을 강제할 능력이 없는 구조를 가지는 나라들에서는 전국적 협약이 (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면) 나타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계는 조정의 여러 메커니즘 가운데 한 가지일 뿐이다. 아마도 가장 넓게 확산되었을지 몰라도 다만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민주주의 역시 조정과 논쟁 해결에 있어서 강력한 메커니즘이다. 위계와 비교했을 때, 민주주의 역시 정당성을 생산한다. 특정한 집합적 결정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물질적 유인이나 제재가 없을 때도 그 결정을 따를 적극적 의사가 그것이다(Weber 1978: 10장).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노동운동 양자는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에 크게 의존했다. 이러한 과정들은 두 개의 상이한 메커니즘 즉, 집합적 및 심의적 메커니즘을 통해 조직간 그리고 조직내 조정을 증가시켰다([표1] 참조).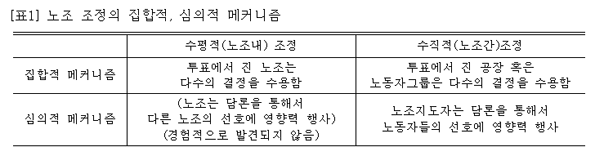
조정의 집합적 메커니즘은 투표를 통한 노동자의 선호를 총화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양국에서 노조 정책결정은 작업장 투표의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이 과정은 논쟁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사실상 총연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노조는 자발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 기능적 관점에서 다수의 결정은 높은 수준의 중앙화된 결사체와 마찬가지의 내적인 강제를 발생시켰다. 노조가 순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인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의 문헌들은 절차적 정당성, 즉 과정이 공정했을 때, 비우호적 정책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의지를 강조한다(Lind & Talyer 1988). 어느 노조 대표는 순응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제공했다. 노조는 연맹 단위가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그들 내부의 반대파가 유사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아일랜드노총의 전직 부사무총장인 Patricia O'Donovan와의 인터뷰, 제네바, 2001. 4. 9).
조정의 심의 메커니즘은 설득 과정과 관계가 있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양국에서 노조지도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단지 투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노조지도자들은 그들이 제안한 해결책이 최상의 집합적 이익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장 모임을 통해 투표를 진행시켰다. 양국의 노조운동은 설득적 의사소통이, 특히 그 의사소통이 전국적 단위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작업장 지도자에 의해 제기될 때, 조합원의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Baccaro 2002a: 424~7). 그들은 또한 의사소통 과정에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을 때, 노동자의 투표 결과는 기대된 것보다 덜 긍정적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다음 장에서는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사례로 돌아간다. 강조점은 이제 내적 과정에 놓여지며, 집합적 및 심의적 메커니즘은 어떻게 내적 응집력과 이들 두 국가의 노동운동에서 조정을 증진시키는가를 살필 것이다.(다음호에 계속)
- 제작년도 :
- 통권 : 제 91호









